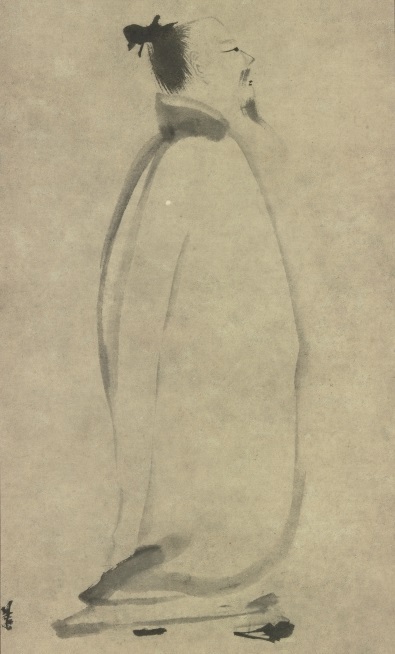몽골족의 문학 예술과 교육·과학 기술 분류문학과 역사학 몽골 민족 문학역사는 매우 유구하며 중국과 외국에 이름이 널리 알려졌다. 신화전설과 같은, 샤머니즘제문(萨满教祭词), 민요, 영웅사시, 서사시, 민간 이야기, 가요, 축문, 찬사 등은 내용이 풍부하고 형식이 독특하다. 따라서 몽골족 인민들의 역사 발자취를 진실하게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또 몽골족 인민들의 정신세계를 충분히 보여주었다. 역사문학 명작전기 『몽골비사(蒙古秘史)』(지역-旧译), 『원조비사(元朝秘史)』, 민간우수서사시 『칭기즈칸의 두 필의 준마』, 『고아전』, 서정가요 「모자가(母子歌)」, 「금궁화피서(金宫桦皮书)」, 「아뢰흠백지가(阿赖钦柏之歌)」 등의 출현은 작가 문학의 흥기와 각종 유형의 민간문학의 지속적인 번영 발전을 보여준다. 문학..